
박씨는 오래전 바닷가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다. 금오도 사람으로 당시 오십 가까이 된 나이였는데도 기운이 좋았다. 젊은 우리들이 나가떨어질 정도로 고된 일이었는데 그는 길게 숨 한 번 내쉬는 것이 전부였다. 역대 이곳 현장 들어온 사람 중에 가장 장사壯士라고 우리들은 입을 모았다. 누군가 힘의 근원을 묻자 그는 이런 대답을 했다.
몇 달 전,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그들 부부는 깜짝 놀랐다.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아들이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책가방도 대문 밖에 내팽개쳐 있는데 공책이며 필통이 다 쏟아져나와 있었다.
“오매, 우리 애기가 왜 저러고 있다냐?”
“이게 뭔 일이여. 응, 도대체 뭔 일이여.”
깜짝 놀란 부부 뛰어들어가보니 아이가 코피를 흘리며 다 죽어가고 있었다.
“정신 좀 차려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어서 이러냐. 응?”
그러자 아이는 부들부들 떨며 붉은 반점이 선명한 손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이와 비슷한 크기의 무언가가 누워 있었다. 문어였다. 문어는 문어대로 먹물을 줄줄 흘리며 퍼져 있었던 것이다.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을 치려고 하지만 잔뜩 얻어터졌는지 동작이 시원치 않았다. 그가 달려들어 멱통을 따놓았다.
집이 바다에 바짝 붙어 있어 그믐사리 때 물이 들면 거의 길높이까지 차오른다. 아이 말대로 하자면, 학교에서 돌아오니 좆나게 큰 문어가 길에 올라와 있던 것이다. 앞뒤 볼 것 없이 책가방 벗어 던지고는 달려들었다. 둘은 뒤엉켰다. 문어는 아이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이를 악물고 마당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니 서로 조르고 물어뜯고 패대기치는 전투를 한동안 치렀던 것이다.
“잘했다. 잘했어.”
크기가 크기인지라 부부는 말려서 팔 생각이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기특한 소리를 했다.
“아부지하고 어무니하고 잡수라고 내가 목숨 걸고 잡았으니께 팔지 말고 잡수시오.”
그러니 어떻게 팔겠는가. 워낙 커서 하루에 다리 하나씩, 몸통은 마지막날, 이렇게 9일간 훌륭한 몸보신을 했으며 자기의 기운은 거기에서 나온단다. 문어가 대표적인 보양식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얻는다면 어떤 힘인들 안 나올까.
그때부터 우리는 힘을 쓰지 않았다. 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사장이 채근하면 아들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옛날이야기에 문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왕왕 나오곤 하는데 생김새 때문에 나온 상상이다. 문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아이와 싸웠던 문어는 자신을 죽어도 놔주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쉬운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붉은색을 칠한 항아리로 문어를 잡았다. 문어단지라고 한다. 된장찌개용 뚝배기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했는데 모릿줄로 줄줄이 엮어서 만들었다. 요즘은 시멘트를 조금 채운 암갈색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갑판에 원통형의 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으면 문어잡이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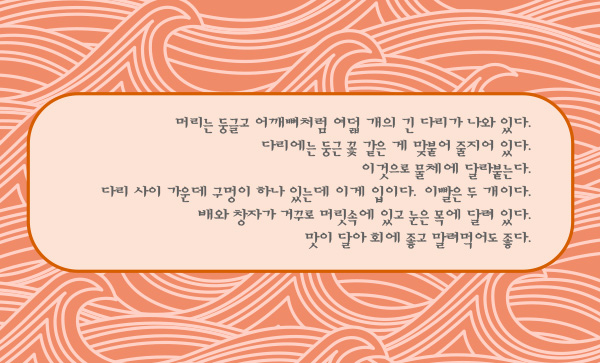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