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이야, 시간이 어찌나 잘 간지, 토요일이 삼 일 만에 돌아온다야.”
맞은편 마을에 사는 할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다. 토요일이 자주 돌아오다보니 어느새 한 해가 끝나간다. 좋든 싫든 일 년을 마무리할 시기이다. 사람들은 왁자하니 송년회를 할 것이다. 마무리란 흘러간 시간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의미이다. 살아낸 시간은 어디 가지 않고 몸과 정신에 차곡차곡 쌓인다. 우리들은 그것을 서로 증명해주기 위해 만나고 술잔을 나눈다.
감성돔 낚시를 갔다. 첫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잠시 누그러질 때였다. 겨울바다의 푸른색은 처연하기가 이를 데 없어, 이별의 아픔을 오래 겪고 난 화가의 수채화 같다. 두보의 시처럼 물이 푸르니 갈매기는 더욱 희다. 하지만 오래 감상하고 있을 것이 못 된다. 풍경과 저녁밥은 별개의 문제이다 (아 글쎄, 이래서 나는 생계형이라는 말이다).
낚시를 하는데 채비가 미처 들어가기도 전에 어떤 놈들이 달려들어 미끼를 따먹는다. 은색 점선이 번뜩거린다. 낚아내보니 역시 학꽁치. 드디어 왔구나. 우리나라 해안가 어디서나 일 년 내내 제 마음대로 출몰하지만 이곳 남쪽 섬에서는 대표적인 겨울 손님이다. 이 손님이 찾아오면 한 해를 정리할 시기가 되었다는 소리이다.
학꽁치는 동갈치목 학꽁칫과의 바닷물고기다. 과메기나 통조림 만드는 꽁치와는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된다. 일반 꽁치는 등 쪽이 짙은 청색을 띠는 등푸른생선이라 살도 붉다. 학꽁치는 흰살생선이다.
이 녀석들이 몰려오면 겨울바다는 은비녀를 뿌려놓은 것처럼 변하고 갯바위나 방파제는 아연 활기를 띤다. 마을 영감님도, 환갑 다 되어가는 노총각도, 어린 학생도 와서 낚는다. 이제는 호호백발 할머니 되어버린 내 친구의 어머니도 누가 버린 낚싯대 주워 와서 우습게 백 마리씩 낚는다. 겨우 내내 노부부 반찬이 될 것이다. 아들딸에게 택배 짐도 만들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일본엘 다녀왔는데 그곳 식당에 갔더니 학꽁치회가 딱 두 점 나왔단다. 거기 사람들은 이것을 약으로 먹고 있더라고 그는 타박했다. 우리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는다.
이 정도면 바다가 생선을 그냥 퍼주는 것이다. 변방의 외로움과 거친 환경을 잘 견뎌낸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겠다. 섬의 풍요는 이런 모습으로 온다.
한번 낚아보면 이렇다. 학꽁치는 대개 눈에 보이는 수면 쪽에서 돌아다닌다. 가볍고 긴 낚싯대에 학꽁치용 바늘을 묶고 새우 살을 아주 조금 단다. 녀석들이 돌아다니는 깊이 정도로 찌를 조절하고 던지면 달려와서 물고 달아난다. 손목 스냅을 한번 줘서 후킹을 시키고 올리면 된다.
먹으려면 머리를 자르고 배를 길게 갈라야 한다. 피부와 뱃속의 색깔이 이 녀석처럼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껍질의 은색 광택은 탄성을 지를 정도로 맑고 밝은데 뱃속의 내장 피막은 아주 시커멓다. 섬사람들은 몸체를 넓적하게 편 다음 칼로 긁어낸다. 초보자는 쉽지 않다. 이때 칫솔을 사용해서 씻어내면 살도 물러지지 않고 좋다.
그런데 이거, 중노동이다. 마릿수도 많고 손도 많이 가기 때문. 학꽁치 들고 들어간 집은 새벽 서너시가 되어야 허리를 펼 수 있다. 쉽게 잡힌 대신 수고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자연 상태의 어떤 것을 음식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받아먹기만 한 사람은 모른다.
맛은 손암 선생의 말씀대로 달고 산뜻하다.
등 쪽으로 칼을 넣어 뼈를 제거하고 넓게 펴면 훌륭한 회가 된다. 이 부분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 씻은 다음 한쪽 면씩 포를 뜨면 더 쉽다. 그것도 어려우면 통째로(등뼈 있는 채 어슷어슷) 썰어먹어도 된다.
첫째가 묵은 김치이고 둘째가 쌈장(참기름과 양파를 넣고 비벼놓으면 더 좋다), 셋째가 고추냉이 간장이다. 내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인데 별 이견 없을 것이다. 채소와 버무려 회덮밥 만들어 먹기도 한다. 부침가루와 계란으로 옷을 입혀 전을 붙이면 12첩 반상이 안 부럽고 김칫국 끓여도 개운하다. 넓게 펴서 가미한 다음 말려 포를 만들기도 한다. 이거 하나로 별의별 조화가 가능하다.
아랫부리가 학처럼 뾰족하다 하여 학꽁치이다. 우아한 이름이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말버릇이 방정맞은 사람한테 “꽁치가 망하는 것은 주둥아리 때문이여”라고 하기도 한다.
감성돔은 얼굴도 못 보고 학꽁치만 서른 마리 정도 낚아왔다. 수북하게 회 떠놓고 소주 한 병 비틀어놓으니 북서계절풍 몰아치는 지붕 낮은 집도 순간 아늑해졌다. 작년에도 이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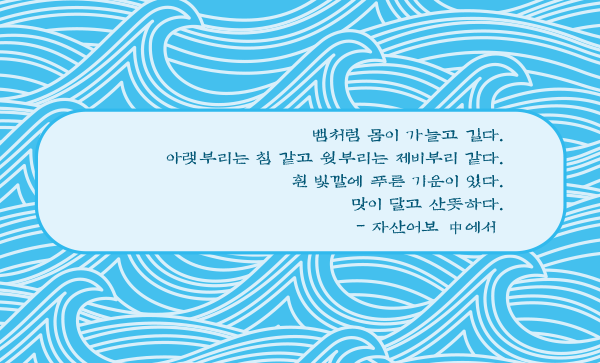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