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어는 똑똑하기로 유명하다. 배에서 잡아 갑판에 던져놓으면 슬금슬금 배수관 쪽으로 기어가는데 사람 눈치를 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백합 같은 조개를 먹을 때는 껍데기를 닫지 못하게 돌멩이를 끼워놓을 정도이다.
하지만 ‘집’과 관련해서는 헛똑똑이가 되어버린다.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해서 옴팍한 것만 있으면 들어앉기 때문에 둥근 단지로 잡는 것이다. 낙지도 그렇다. 항구에서 낚시를 하다보면 신발이나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게 걸려 올라올 때가 있는데 어쩌다 낙지가 들어 있기도 하다.
문어의 독특한 버릇 중 또하나는 붉은색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이다. 문어단지가 붉은색인 이유이다. 문어 키우는 양식장에 가서 붉은 천을 늘여놓으면 슬금슬금 다가온다. 이 정도니 공안검사가 봤다면 먹지 않고 모두 구속했을 것이다.
낚시에 간혹 올라올 때도 있다.
물고기 같은 몸부림 없이 묵직하게 끌고 들어가기만 한다면 문어일 가능성이 높다. 문어가 물었다 싶으면 빨리 올려야 한다. 바위에 빨판이 붙어버리면 채비가 터진다.
올라왔다 하더라도 초보자들은 저가 더 놀라 허둥대다가 놓치기 쉽다. 나도 예전에 저수지에서 붕어 낚시를 하다가 커다란 자라가 올라와서 허둥댄 적이 있다. 낚시하다보면 이렇게 느닷없을 때가 있다. 자라가 귀하고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랐다. 바늘을 뱉어낸 녀석은 짧은 다리로 버둥거렸고 나는 급한 대로 낚싯대 손잡이 끝부분으로 녀석의 등을 눌렀다. 그러자 모가지가 뱀처럼 주욱 늘어나더니 저를 누르고 있는 것을 덥석 무는 게 아닌가. 자라목이 그렇게 길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엉겁결에 낚싯대를 들었고 녀석은 도망쳤다. 나는 어어어, 소리만 한 예닐곱 번 냈다.
다시 문어.
놓치기 싫다면 배짱 좋게 목 부분을 움켜쥐면 된다. <자산어보> 설명대로 머리 부분이다. 둥그런 위쪽이 배다. 그렇지만 편의상. 팔목을 감고 빨판으로 빨아들이는 느낌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잡으면 온 식구 행복하다.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곧잘 도망을 치는 녀석이라 보관을 단단히 해야 한다.
삶을 때 식초와 설탕을 조금씩 넣는다.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감칠맛이 돌게 한다. 너무 삶으면 질기다. 낙지도 마찬가지이지만 머리와 다리가 익는 시간이 다르다. 다리가 다 익었으면 잘라내고 머리 부분만 더 삶는다.
암컷은 봄철에 알이 차 있다. 알맛이 기가 막히다. 아주 잔 햅쌀로 밥을 지어놓은 것 같다. 씹는 질감이 끝내준다. 머리를 가르면 먹물이 들어 있다. 이게 소스 역할을 한다. 찍어먹으면 된다. 너무 익히면 먹물이 굳어버린다. 다리는 어슷어슷 잘라 무쳐놓으면 좋은 반찬이 된다. 죽을 쑤려면 북어처럼 방망이로 두들긴다.
봄철에 고흥군 도양항에 가면 문어 낚는 거룻배들이 많다. 도양항은 녹동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바로 앞에 소록도가 있다. 그곳 어부는 붉은색 천을 달고 돼지비계를 붙여 낚는다. 자그마한 거룻배들이 여기저기 떠 있는 풍경이 볼만하다. 요즘도 할 것이다. 간혹 해양경찰에 쫓겨 다니긴 하지만.
문어는 제 다리를 뜯어먹고 산다. 문어 빨판은 1200개 정도이다. 흡반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먹이를 잡기도 하고 바위에 붙어 있기도 한다. 바위에 붙어 있는 놈을 억지로 떼어내다보면 빨판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 정도로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다. 또 이 녀석은 자신의 다리를 잘라먹는다고 한다. 배가 너무 고프거나, 저가 먹어봐도 맛있거나, 둘 중 하나는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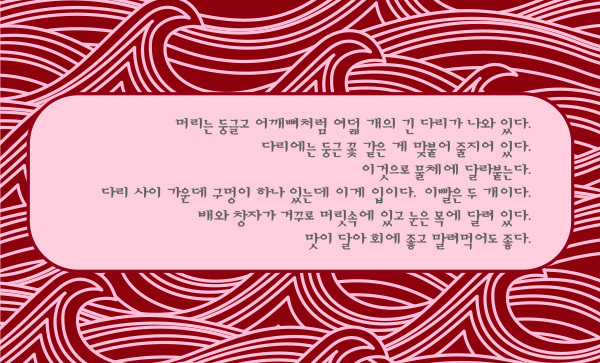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