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채는 홍합인데 흔히 담치라고 한다.
남쪽 가까운 바다에 흰 스티로폼이 밭이랑처럼 늘어서 있으면 거의가 홍합이나 굴 양식장이다. 나는 80년대 후반 여러 해 동안 홍합 현장 일을 했다. 작업선이 양식장에서 따오면 바닷가 현장에서 씻고 삶고 까고 한 다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게 기본구조이다.
현장에서 삶은 홍합을 까는 이는 할머니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이는 중년 여인네였다. 그 인정물태를 배경으로 장편 소설 <홍합>을 쓰기도 했다. 사내들은 주로 얻어먹는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부류가 나뉘었다.
머리가 부숭부숭하고 얼굴에 잠이나 술기운이 덜 가신 인물들이 운동복 바지에 슬리퍼 끌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면 딱 동네 남자들이었다.
현장에는 인부들이 마시는 막걸리가 노상 준비되어 있고 솥에 홍합이 있으니 금상첨화였다. 별생각 없는데 굳이 주겠다니 인정으로 받는다는 투로 한잔 받아 마시고는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발랑 벌어진 홍합을 솥에서 들고 까먹는데 어느 누구라도 입 다물고 그냥 먹는 이가 없었다.
“참말로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네.”
그렇게 사살 한마디씩 하며 훌러덩 까먹고는 인사로 책임자 붙잡고 요즘 시세가 어떻니, 단가가 저떻니 마진율은 얼마나 되니 마니, 몇 마디 뒤를 늘리는 것으로 모양새를 맞추었다.
― <홍합> 중에서
아닌 게 아니라 홍합은 바다에서 요물로 통한다.
생긴 것 때문에 생긴 말이려니 싶지만 그게 아니다. 몸통과 알 크기가 빗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껍데기는 큰데 삶아놓으면 알이 조그마할 때가 종종 있다.
보통 샛바람(동풍)이 불고 나면 살이 쪼그라들며 엉덩이 부분에 까만 똥이 찬다. 하늬바람(서풍)이 불면 다시 살이 찬다.
포장마차 따끈한 홍합 국물에 소주 한잔은 추운 겨울 강력한 유혹이다. 그런데 이건 양식한 것이다. <자산어보>에 나오는 담채와는 종자가 다르다. 진주 담치, 지중해 담치라고 하는데 개화기 때 화물선에 붙어 들어와 퍼진 것으로 추측된다. 연승줄에 매달아, 수중에 띄워 키운다.
담채는 자연산 홍합이다.
이것은 잠수를 해야 볼 수 있다. 수심 5미터 이상 들어가면 굵은 게 보인다. (사람 손 안 탄 곳은 조간대에서 볼 수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부분을 조간대라 한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굵다, 어른 뼘보다 큰 것도 있다.
그러니 한 자 정도 된다고 했을 것이다. 실학자답게 손암 선생은 크기를 꼼꼼하게 기록하셨는데 몇몇 가지는 요즘 것보다 더 크게 나온다. 당시의 것이 더 컸을 터이지만 근사치에 가까우면 한 자, 두 자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신 것 같다.
자연산은 모두 해녀들이 잠수질하여 빗창으로 따오는 것이다. 빗창은 끝이 반듯한, 뾰죽한 것과는 반대인 창이다. 그것으로 바위에 뿌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담치 터럭을 찔러 떼어낸다.
또하나의 토종이 갯바위에 빽빽하게 달라붙어 있는 굵은줄격판담치이다. 갯바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종이다. 우리 마을에서는 샛담치라 부른다. 그중 실한 놈을 따와 반찬으로 쓰기도 한다. 모두 한여름에는 종종 독소가 생기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식은 주기적으로 독소 검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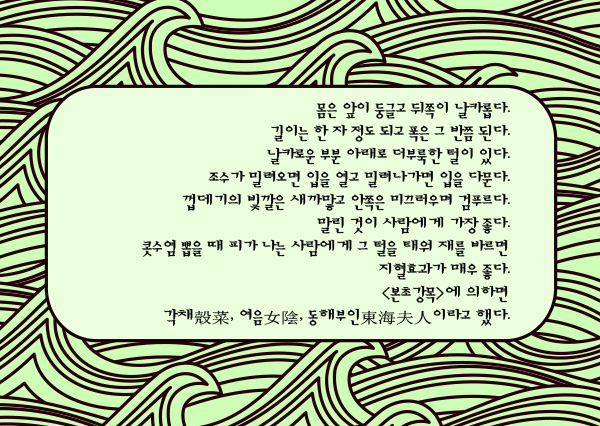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