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유細乳는 작은 돌기를 뜻한다.
보양제와 관련하여 떠돌아다니는 말에 ‘바다엔 해삼, 육지엔 산삼, 하늘엔 비삼’이 있다. 듣기로 비삼은 까마귀라고 한다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중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해삼이다.
예전 포장마차를 할 때 날마다 오는 단골이 있었다. 검은 뿔테 안경에 낡은 서류가방을 든 중년 사내로 대서소나 동사무소 호적계 쪽 분위기였다. 늦은 시간 늘 취한 모습으로 찾아와 서비스 국물 안주에 소주 한 병 마시고 갔다. 내 포장마차가 그날 음주를 마무리짓는 자리로 보였다. 나도 그렇게 얻어먹듯 마신 경험이 많기에 편히 마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남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하루는 빈자리가 없었다. 그는 기둥 뒤에 서서 마시겠다, 밖에서 마시겠다, 고집을 부리다가 나갔는데 오 분쯤 뒤에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다시 돌아왔다.
“저기 저, 해삼 좀 주세요.”
“아이구 참, 왜 그러세요. 그렇다면 하던 대로 그냥 국물에 드세요.”
“오늘은 안주를 먹을 생각입니다. 해삼 주세요.”
그는 의연하게 말을 맺었다.
나는 결국 해삼을 썰어주었고 그는 포장문 틈에 낀 채 서서 마셨다. 한동안 바쁘게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손님 하나가 저쪽 좀 보라며 나에게 눈짓을 했다.
사내는 안경이 떨어질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젓가락으로 해삼을 집어올리는데 번번이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입만 벌렸다, 다물었다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또 한잔 마시고 재도전을 하는데 똑같았다. 뒤늦게 숟가락을 주었으나 그는 그새 다 마시고 휘청거렸다. 해삼 한 접시만 고스란히 남았었다.
<자산어보>가 나온 게 1814년이니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해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이 녀석에게 사포닌과 비슷한 홀로수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긴, 경험의 축적이지. 어떻게 알았을까, 에는 옛날 사람은 몰랐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들은 알았고 우리는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을까.
해삼의 약리작용을 살펴보면, 자양강장부터 해서 허약 임신부, 약한 뼈와 연골, 당뇨, 천식, 위장병, 관절염, 술독, 피부염에 심지어는 무좀 (<본초강목>에 ‘분말가루를 바르라’고 나와 있다)과 습진까지 다양하게 관여한다. 진통 효과도 좋고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니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 수준이다. 거북손이 살아 있는 양념통이라면 이 녀석은 살아 있는 약통인 셈이다.
서양에서 바다의 오이라고 부른다는 해삼은 정작 오이의 계절인 여름에는 잠을 잔다. 수온이 올라가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내장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깊은 잠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귀하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정력제라고 환장을 하는 것들 대개가 계절잠 자는 것들 아닌가. 그렇다면 좋다는 것 찾아다닐 시간에 잠을 푹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 되겠다.
여름을 제외하고 물 빠진 바닷가 갯돌을 뒤져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촉수가 방사성으로 나 있는 곳이 입, 반대쪽 구멍이 항문이다. 몸길이 방향으로 칼로 자르면 내장과 생식소가 나온다. 하얀 것은 수컷. 노란 것은 암컷의 생식소이다. 내장에는 펄이 들어 있다. 손가락으로 훑으면 펄이 빠지는데 잘 끊어진다.
이 녀석은 공격을 받으면 내장을 조금 내주고 도망을 치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자신의 것을 꺼내 먹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생식소와 내장을 귀하게 친다. 이것으로 담근 젓갈은 매우 비싸다.
몸통은 짠맛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 작은 놈들이야 주물러 씻으면 되지만 조금 큰 놈은 한동안 찬물에 담가두어야 한다. 급할 때는 얇게 저민 다음 물을 갈아주면서 이십 분 정도 담가두면 먹을 수 있다. 볏짚에 묶어두면 녹아 없어진다는 것은 해삼 단골 레퍼토리. 그래서 해삼 먹고 탈이 나면 볏짚을 달여먹기도 한다.
보통 청해삼과 흑해삼이 잡힌다. 내가 사는 거문도처럼 깊은 바다에서는 홍해삼이 난다. 홍해삼은 맛도, 약효도 훨씬 뛰어나다고 해서 값도 일반 해삼의 두 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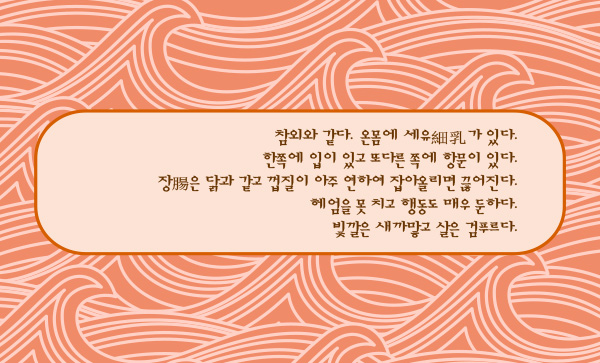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