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도 김을 해태라 칭한다. 그래서 인용했지만, 본문 뒤편에 나오는 자채(紫菜, “뿌리가 돌에 붙어 있다. 가지는 없다. 검붉은 보라 빛깔로 맛이 달다”)가 설명으로는 김에 더 가깝다.
김은 본격적인 양식 이전에는 갯바위에서 뜯어왔다. 뜯기도 했지만 긁어왔다는 게 옳은 표현이다. 긁으면 더 많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 이러면 이거, 말 그대로 자연산 돌김이다.
사리가 되어 바닷물 가라앉으면 그동안 잠겨 있던 부분이 햇살 아래로 몸을 드러낸다. 온갖 해초가 달라붙어 있어 마치 섬의 테두리를 굵은 고딕선으로 칠해놓은 것만 같다. 덕분에 영등사리에는 섬의 영토가 가장 넓어진다.
내 어렸을 때는 많이들 하러 다녔다. 어린이 늙은이 구분 없이 바위에서 달라붙어 벅벅 긁어댔다. 전복 껍데기를 주로 썼는데 워낙 양이 적어 몇 시간 동안 해도 소쿠리 반도 안 찼다. 그러다가 획기적인 도구가 등장했다. 바로 구두약 뚜껑. 전복 껍데기처럼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고 손에 쥐기도 편했다. 떨어뜨려도 찾기 쉬웠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다녔다. 해녀였던 할머니는 물질을 가면 후이 후이 숨비소리를, 김 긁으러 가면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내가 긁어놓은 것에는 이런저런 파래가 섞여 들어갔으나 할머니가 해놓은 것은 검붉은 광택만 반짝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면 잡물을 추려내 씻어낸다. 물 담은 함지박에 발을 띄우고 네모난 나무틀을 그 위에 놓는다. 한 종지 정도 김을 틀에 넣고 손으로 편다. 틀을 들어낸 다음 발을 들어 올린다. 그러면 반듯한 김 한 장이 만들어진다. 감탄도, 그것을 받아다가 돌담에 60도 각도로 세우는 것도 내 몫이었다.
그날은 김국을 먹을 수 있었다.
김국은 미세한 기름이 뜨기 때문에 팔팔 끓여놓아도 수증기가 나지 않는다. 멋모르고 먹었다가 입천장 데기 딱 좋다. 반갑지 않은 손님, 이를테면 손버릇 나쁜 사위가 찾아오면 이것을 끓여주기도 했단다.
생김이 없으면 질 좋은 마른 것으로 하는데 육고기나 해물을 식성대로 넣고 끓이면 된다. 여름에는 냉국이 좋다. 김을 구운 다음 잘게 부순다. 한 사람당 서너 장이면 충분하다. 차갑게 식혀놓은 육수에 김을 넣고 저은 다음 깨를 얹으면 끝. 고명을 따로 만들면 더 좋고.
급하면 슈퍼에서 파는 냉면 육수를 쓴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얼음물에다가 간장으로 간한다. 조미료를 살짝 넣는다. 내가 요리할 때 유일하게 조미료를 쓰는 경우가 이 음식이다. 싫으면 물론 안 넣어도 된다.
그렇게 돌담에 세워놓은 김은 이삼일이면 바짝 말랐다.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50장씩만 묶어놓아도 아주 두툼했다. 자연산 돌김의 진가를 알려면 막 지은 뜨거운 쌀밥과 차갑게 식힌 콩나물국이 필요하다. 뜨거운 밥을 김으로 둥글게 싼 다음 차가운 콩나물국에 적셔 먹는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대류작용을 하듯 차이를 두며 뒤섞이는데 그 접점에서 고소한 맛이 풍겨나온다.
요즘은 자연산 돌김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시중에 나온 돌김도 종자를 이용한 양식 김이다. 일반 김보다는 돌김 맛이 나긴 한다. 그나마 잘 골라 사야 한다. 자연산 돌김 상표 번듯한 것 중에도 일반 양식 김인 경우가 간혹 있다.
혹, 외진 섬을 여행하다가 김발 줄줄이 세워놓은 게 보이면 무조건 주인을 찾는다. 김발 세워놨다면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고 완제품이 있을 확률이 높다. 깎지 말자. 만드는 과정을 보았다면 눈물 난다.
음력 2월까지가 제철이라 겨울 갯바위에 잔뜩 붙어 있지만 요즘은 채취하는 사람이 없다. 대신, 일전에 전라남도 관광진흥과 주선으로 서남해안을 돌 때 만재도에서 모처럼 그 풍경을 보았다. 역시나 자식들 모두 육지 내보내고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셨고 마을에서 혼자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 할머니 돌김은 그날 모두 팔렸다. 50장에 5천 원. 내 할머니처럼 그분도 답례로 울긋불긋한 사탕을 내놓으셨다. 나는 두 톳을 샀는데 연극평론가 안치운씨가 빈손인 걸 보고 하나 주고 하나만 들고 왔다. 숨겨놓고 혼자 먹었다.
본문에 나오는 강리는 일명 꼬시래기이다. 김과는 다르다. 종종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홍조식물 꼬시래깃과의 해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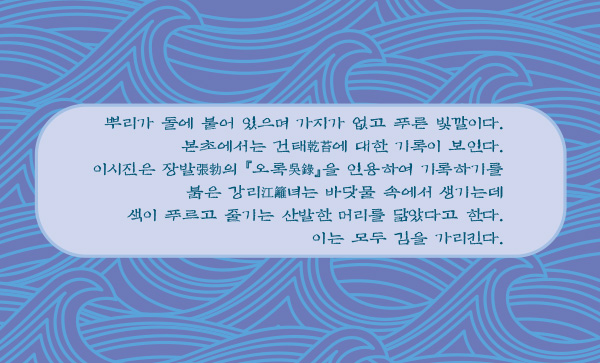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