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원 석사(공학 전공) 과정 학생인 김모(29)씨는 지난해 자신의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정부 과제에 연구원으로 투입됐다.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해 돈을 벌면서 연구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 며칠 뒤 지도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네 계좌로 100만원 입금했는데 40만원만 현금으로 가져와라." 김씨는 별 수 없이 지도교수 말에 따랐다. 그는 "지도교수의 말을 거역하려면 이 바닥을 떠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약사에 취직한 최모(35)씨는 요즘 생활고 시달리고 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압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12년 전 석사 과정 1학년 시절 지도교수의 지시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실험 데이터를 입력한 게 화근이었다. 실험이 조작으로 판명나면서 대학은 건강보험공단에 배상금 38억원을 냈고 지도교수와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지난 4월 법원은 이들에게 25억원을 내라고 주문했다. 이후 지도교수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더이상 최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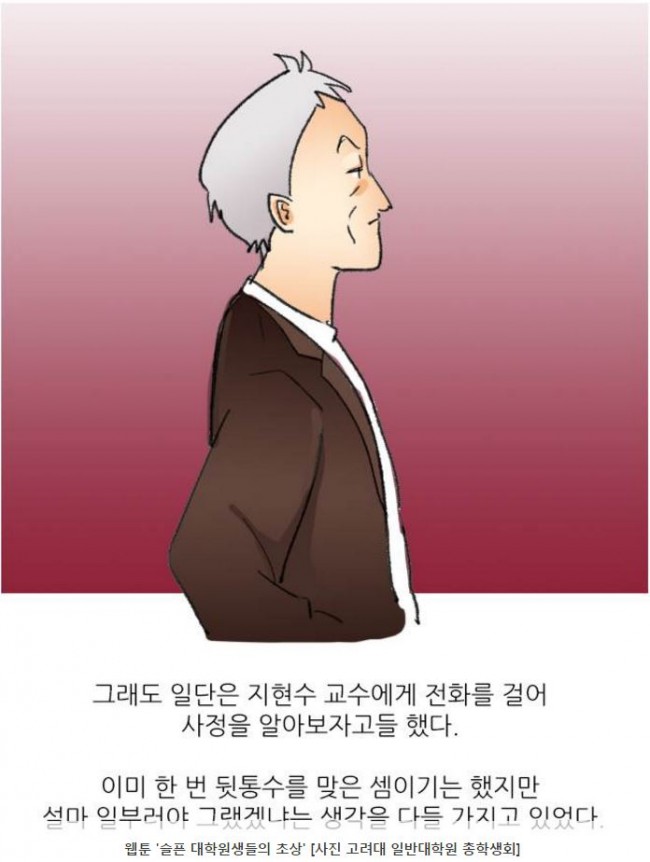

최씨 사례는 최근 웹툰으로 제작돼 주목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대학원생들의 제보를 받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사진)을 통해서다. 최씨는 "석사 1학년에게 지도교수는 신 같은 존재라 감히 의심할 생각도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웹툰을 본 사람들은 '대학원생은 누굴 믿어야 하나' '거의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남의 일이 아닌 이야기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교수와 '갑을(甲乙)' 관계로 얽힌 '잘못된 만남'으로 고통 받은 대학원생들이 여전히 많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원생 19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은 '교수로부터 욕설 등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11.4%는 '교수의 논문 작성, 연구 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강태경(28) 총학생회장은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의 졸업과 취업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보니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대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웹툰을 제작할 때도 다들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려해 제보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를 갖춘 일부 대학원을 제외하곤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이 학내에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 대학원생 이모(28)씨는 "억울한 일이 생겨 학교나 동료들에게 말해도 '교수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니 참으라'고 말할 뿐이다.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도 소외받는 을 중의 을이다"고 말했다. 인문학협동조합 허민 연구환경정책위원장은 "바뀌어야 할 건 교수와 대학원생 개개인이 아니라 이러한 관행이 인정되는 학계의 전반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출처: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