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은 갈치 시즌이다. 밤마다 갈치배 집어등 불빛이 수평선에 환하다. 바다 한가운데 도시가 하나 들어선 것 같다. 섬의 활기는 겨울에는 삼치, 여름에는 갈치에게서 온다. 하지만 두 가지를 비교하면 여름 갈치철이 훨씬 볼만하다. 상어, 장어, 가오리, 복어, 한치, 요즘 들어서는 참치도 같이 낚아오기 때문이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는 “갈치를 염건하여 서울로 보내는데 맛이 좋고 값이 싸다”고 나와 있다. 값이 쌌단다. 지금도? 택도 없는 소리. 갈치는 비싸다. 손으로 낚아오는 것이라서 그렇다. 2천 와트짜리 집어등 수십 개 켜놓고 한밤중에 잡는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내가 사는 거문도에서는 주로 백도 근방에서 어장이 형성된다.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에 출발해서 어장까지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 낙하산처럼 생긴 물닻을 놓고 밤새 낚는다. 한 배에 보통 다섯 명 정도 승선. 아침에 돌아와 수협 공판을 하는데 10킬로그램 기준으로 중간치가 평균 10여만 원 한다. 값이 그때그때 차이가 나기 때문.
어장이 나면 여러 곳 배들이 모인다. 제주 배가 낚으면 제주 갈치, 거문도 배가 낚으면 거문도 갈치가 된다. 이곳 수협 값이 좋으면 제주 배도 이곳으로, 제주 단가가 높으면 거문도 배도 제주로 간다. 그러니 제주 갈치, 거문도 갈치, 구분하는 것 아무 소용 없다.
주문을 하면 얼음 포장된 무지갯빛 갈치를 받아볼 수 있다. 거의 청동색이다. 비린내도 전혀 없다. 비린내는 비늘이 산소를 만나 생기는 산화작용, 즉 산패 때문에 생긴다. 중국산이나 트롤선이 그물로 잡아 냉동해온 것이 그렇다.
이 녀석은 좀 독특하게 이동한다. 서서 헤엄을 친다. 꼬리지느러미가 없는 탓에 등지느러미로 움직이기 때문. 섬에서는 늦가을 갈치를 쳐준다. 뭐든 살아 있는 것은 월동 전에 살이 오르는 법 아닌가.
손암 선생은 갈치를 무린어(無鱗魚), 즉 비늘 없는 생선 종류에 포함시켰는데 피부의 은색 가루가 비늘이다. 구아닌이라는, 색소의 일종으로 회로 먹을 때는 칼로 긁어내야 한다. 호박잎으로 긁기도 한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 힘줄도 걷어내야 한다. 익힐 때는 상관없다. 지혈작용도 하는 구아닌은 모조진주나 매니큐어, 립스틱에 쓰인다. 키스는 갈치 비늘을 주고받는 행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갈치는 회, 구이, 찜으로 먹는다. 또 하나, 국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호박을 넣어 끓인다. 거문도에는 여인네가 말했던 항각구 국이라는 게 있다. 이게 갈칫국이다. 항각구는 엉겅퀴의 이곳 말이다.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들에 핀 엉겅퀴를 팍팍 삶아 쓴맛을 우려낸 다음 된장에 버무리고 갈치 넣고 젓국으로 간 맞춘 게 항각구 국이다. 단맛의 갈치와 쌉싸래한 엉겅퀴가 잘 어울린다.
“국이 좋으니까 밥 한 그릇 먹어봐.”
하면, 이 국이 있다는 소리이다. 섬사람들이 잔병치레 안 하는 이유가 갈치와 엉겅퀴를 자주 먹어서 그렇다고들 한다. 육지로 이사 간 이들이 소증을 가장 자주 느끼는 게 또 이 국이다. 이곳에는 “갈치 뱃진데기(뱃살과 내장) 못 잊어서 육지로 시집 못 가겄네”라는 말이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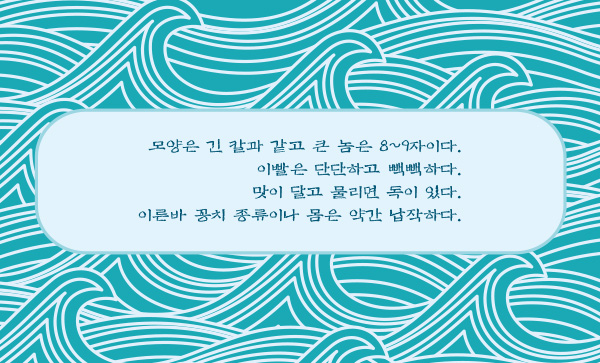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