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나는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에 있는 후배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남한을 따로 떼어내 이원면에 줄을 묶어 올리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내륙 깊숙한 곳이다.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소리. 그래서 그곳 아이들은 비행기는 알아도 배는 잘 몰랐다.
대전에서 완행기차 타고 이원에서 내린 다음 산을 타고 오르고 수몰지구 저수지를 한참이나 돌아 혀를 빼물 정도 되자 마을이 나타났다. 내 후배는 마을 생긴 이래 최초로 4년제 대학생이 된 이였다. 대학 합격통지서 받은 날 마을에서 돼지 잡아 잔치도 했다고 한다. 이름도 이원봉이다. 이원에서 봉 난 것이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장찬리 이장이 되고 말겠다고 다짐했던 그는 면장으로 목표치를 슬그머니 올려놓기도 했다.
원봉이 집에서는 여러 곳 밭농사를 했다. 인삼도 키웠다. 그는 토요일마다 집으로 달려가 이틀간 일 도와주다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잘 안 가는 눈치였다. 효심이 남달랐던 아이가 그러고 있어 내가 이유를 물었다. 그는 답했다.
“내가 집에 가는 날로만 이장님이 반상회 날을 잡어요. 나를 옆에다 앉혀두구 말씀을 하시는디 말끝마다 꼭꼭, 내 말이 맞지 왼벵아? 하시는규. 그것은 그렇다구 쳐두 동네 사람들이 공문서 같은 것이 와두 나한테 달려오구 모르는 한자만 하나 있어두 쫓아와요. 아주 죽겄시우.”
아닌 게 아니라, 같이 간 후배들과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데 아이구, 왼벵이 대학교 친구들이 왔다던디, 하면서 마을 어른들이 구경을 오셨다. 우리는 착실히 얼굴을 보여드렸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와 누님은 한참 동안 부엌에서 달그락 톡톡톡거렸다. 처음으로 가본 깊은 산골이라 밥상이 어떨까,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다. 버섯막과 인삼막이 곳곳이었고 집집마다 산나물 말린 것도 그득했던 것이다. 뱀이나 오소리 따위는 예사로 끓여먹는다고도 들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들어야 될 밥상이 들어왔다.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 뜻밖에도 밥상 위에는 미역국에 김, 멸치, 꽁치구이 같은 반찬이 가득했고 가운데 펄펄 끓는 뚝배기가 놓여 있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바로 고등어조림이었다. 나는 멈칫했다. 정육점 주인이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삼겹살 대접받은 셈이고 심마니가 곰취 선물 받은 꼴 아닌가. 하지만 구하기 힘든 게 귀한 법. 어머니께서 얼마나 아끼던 것들일까 싶어 먹는 동안 점점 미안해졌다. 우리는 산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다에서 항구로, 항구에서 내륙 도시로, 그리고 군이나 면을 거쳐 이 깊은 산속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손을 거쳤을까. 하지만 그 덕에 동태 멸치 따위와 더불어, 고등어의 미덕은 방방곡곡 어디나 있다는 것이다.
소태처럼 쓴맛이 돌 정도로 간을 해놓아도 훌륭한 반찬이 되는 탓에 만만하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고등어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안동 사는 안상학 시인은 간고등어가 안동댐에서 난다고 한다. 임하댐에서는 아예 간을 한 채 양식도 한단다. 그럴 리가.
아무튼 김정식, 이삼순씨가 마을마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륙 사람이 섬에 들어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고등어 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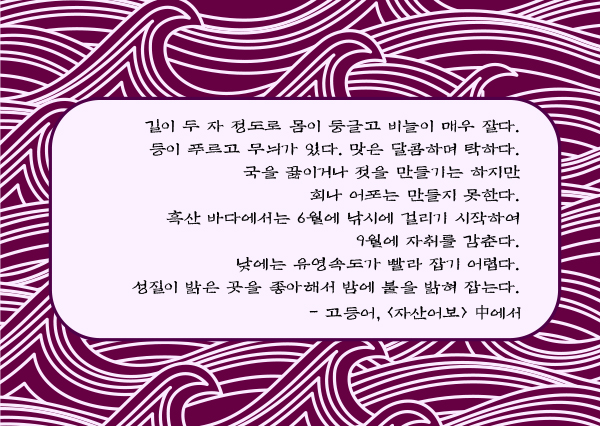
© 한창훈 작가의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서
